선진국 필리핀, 가난한 한국에 체육관을 선물하다
1963년 2월 1일,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장소가 문을 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체육관인 장충체육관이 그곳이다. 최고 실세였던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참석해 테이프를 끊을 정도로 관심이 컸다. ‘운동경기는 눈, 비가 내리지 않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던 시절 장충체육관은 지금으로 따져보면 날씨와 관계없이 축구나 야구 경기가 열릴 수 있는 돔 구장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는 축구, 야구가 아닌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정도였다. 시설로는 1500와트의 백열등 40개, 1000와트수은등 40개로 조명이 가능하고 관람석에도 40개의 전등이 가설돼 야간경기에도 끄떡없다는 게 당시의 언론 보도였다. 심지어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과 샤워룸, 네 개의 변소가 있다는 것도 자랑거리였다.
그리고 지금으로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하지만 당시로서는 당연했던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었다. 이 체육관은 필리핀 건설회사가 지었다. 게다가 필리핀은 건설 인력에, 공사비까지 원조해줬다. 당시 우리건설업체 실력으론 돔 형태의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 당시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부자 나라였다. 지금은 그저 그런 동남아 관광지, 산업연수생, 영어를 할 줄 아는 가사 도우미 아줌마의 나라 정도가 떠오르지만 필리핀은 당시로서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었다. 2차 대전 승전국인 미국의 식민지였던 데다 서양식 교육, 가톨릭 문화 전통 등이 결합되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강대국으로 꼽혔다. 한마디로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로 분단과 전쟁까지 겪은 우리와는 차원이 달랐다. 한국전쟁 당시 필리핀은 UN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기도 했다.
스포츠사적으로도 유서깊은 장충체육관
국가 간의 관계 이외에 스포츠사적으로도 장충체육관은 유서 깊은 곳이다. 개관식에서 박정희 당시 의장은 ‘체육을 통하여 개인의 명예는 물론 국가의 명예를 더 높일 사명을 지니고 있는 만큼 민족정기에 직결되는 체육정신을 진작시켜 주기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충체육관이 개관된 후로는 박정희장군배쟁탈 아시아여자농구 대회 등 여러 경기가 열렸다. 특히 1966년 6월 25일 프로복서 김기수가 이탈리아의 니노 벤베누티를 15회 판정으로 꺾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챔피언에 오르기도 했다. 또 염동균도 장충체육관에서 네 번째 세계챔피언이 됐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챔피언인 홍수환과 유제두는 적지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일본에서 타이틀을 따냈다. 또 장충체육관은 60~70년대 ‘박치기 왕’ 김일의 프로레슬링 경기가 펼쳐진 곳이다. 김일의 필살기인 박치기가 안토니오 이노키나 자이언트 바바 같은 상대의 이마에 작렬하고 국내파 레슬러 장영철의 드롭킥이 상대 턱에 꽂히면 전국은 열광했다. 레슬러 천규덕이 당수로, 맨손으로 황소를 때려잡던 곳도 장충체육관이다. 천규덕은 당수 단 두 방에 소를 쓰러뜨릴 수 있었지만 당시 집권당인 공화당의 상징이 황소여서 당국의 무언의 압력 때문에 10여차례 주먹을 휘둘러야 하는 타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각하가 문을 연 체육관에서 각하 정당의 상징물을 때려눕히는 것은 불경이었으리라.
물론 체육관에서 체육만 한 것은 아니다. 정치사적인 의미도 빗겨가지 않는다. 이곳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1972년, 1978년과 전두환 전 대통령 1980년, 1981년이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선거는 축제의 장이어야 했지만 ‘체육관 선거’ ‘체육관 대통령’이라는 개운치 않은 이름을 얻기도 했다. 민의가 반영되어야 할 선거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 선거인단 등에 의해 뽑힘으로써 민심과 단절된 그들만의 지도자라는 그림자도 남았다. 1987년 6월 항쟁의 한가운데에서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자기 당의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곳은 장충체육관이 아닌 잠실체육관이었다. 명동과 시청 앞 등 시내 한복판에서 가깝고 주변에 동국대학교 등이 있어 대학생 시위 등으로 정상적인 대회 진행이 이뤄지지 못하리라는 우려도 있었으리라. 5공 전체의 목표였던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대회가 열릴 잠실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도 의미 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을 듯하다.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체육관 대통령 전두환과 체육관 후보 노태우가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면서 더 이상 체육관 대통령은 나오지 않게 됐다.
개관 후 수십 년이 지나면서 필리핀과 한국의 위상도 크게 바뀌었다. 아시아의 선진국 필리핀은 독재자 마르코스의 전횡과 폭압 통치 등이 이어진데다 게릴라 세력과 잦은 쿠데타 위협 등이 내재하며 선진국 대열에서 멀어져갔다. 1986년 마르코스 대통령은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인 ‘피플파워’에 의해 코라손 아키노에게 권력을 내놓고 미국 망명길에 올랐다. 하지만 그 뒤 필리핀은 피플파워를 역사 속에서 자랑하게 되지만, 식량 값 급등과 부패로 인해 ‘민주주의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역사의 아이러니
한국은 유신과 군부독재, 민주화 등 다양한 이력을 거치며 수혜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됐다. 체육관 대통령은 직선 대통령으로 변했다. 나라가 변했을 뿐 아니라 장충체육관도 변했다. 60~70년대에는 첨단 체육관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도가 심화되고 바닥 길이 36m가 협소해 이용에 불편이 컸다. 2010년에는 체육경기연간 71일보다 공연 등 일반 행사 연간 169일가 더 많았고, 이용인원도 2002년 52만 9555명에서 2010년 26만4639명으로 50퍼센트나 감소했다. 세계챔피언들이 있던 곳은 땡처리 의류들이 자리하기도 한다.
개관한지 50년째 되는 2013년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여 당시로는 첨단을 강조한 체육관으로 재단장하였다.
항상 새것이라고 말하지만 몇 년 또는 몇십 년이 지나면 곧 옛 것이 되고 만다. 선진국도 후진국이 되고, 최빈국도 올림픽, 국제회의 G20 등을 거치며 국제 사회의 지도적 국가로 도약했다고 자랑한다.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엇갈린 운명이 꼭 그렇다. 변하지 않는 것은 스포츠를 보는 사람들의 열기다. 김기수와 김일을 보며 외치던 아저씨들의 함성은 배구의 문성민이나 김요한을 외치는 오빠 부대와 꼭 닮아 있다.
국내 한 건설회사는 필리핀에 그 나라 최대 규모의 첨단 돔 체육관을 2014년까지 지어 주었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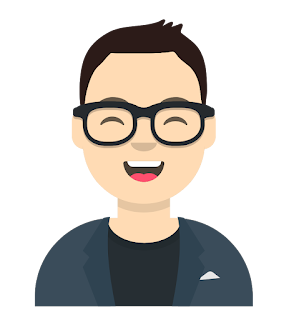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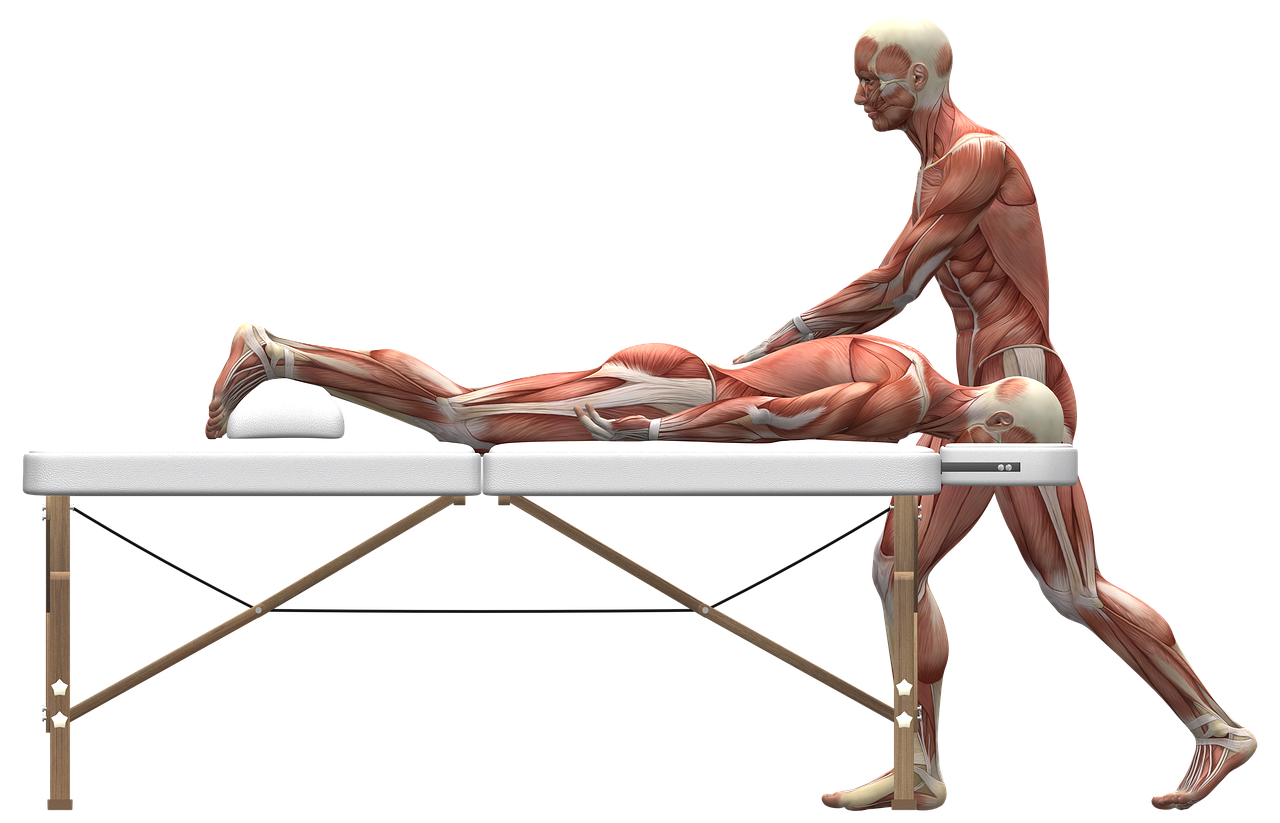
답글 남기기